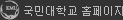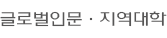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너섬情談] 무선 이어폰과 이웃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 |||
|---|---|---|---|
|
스마트폰을 쓰면서부터 이어폰은 항상 귀에 꽂혀 있었다. 지루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정말 유용했다. 음악뿐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가 있어서다. 뉴스와 해설을 맛깔나게 전한다.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고 평소라면 놓쳤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스페인어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배울 수도 있다. 놓친 부분은 간단하게 되돌려 들을 수도 있다. 장거리 고속버스라도 타면 이만한 벗이 없다. 주위의 소음을 물리치고 잠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을 열어준다.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는 환호했다. 주렁주렁 늘어지고 계속 꼬이는 줄이 없으니 보기에도 쓰기에도 편리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릴 때 바지 주머니 대신에 멀찌감치 음료수대 옆에 놔두어도 잘 들리니 필수가 됐다. 진정으로 신체 일부가 돼 곁을 떠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쓸모가 늘어났다. 화상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수업에서 무선 이어폰은 필수다. 컴퓨터와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음량을 유지해 준다. 화난 사람처럼 소리를 높이지 않고 마치 대면처럼 평온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다.
신형에 새로이 도입된 주변 소음 제거 기능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끈다. 버튼을 꾹 눌러 기능이 활성화되면 주변이 한 걸음 더 물러선다. 온 세상 소리가 지워지고 고요해진다. 자동차 소음도 풍절음도 옆 사람 목소리도 소거된다. 완벽하게 혼자만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공간을 구성하는 감각에서 청각의 힘이 이토록 큰 것인지 실감할 정도다.
맨 귀로 다닌 지난 며칠은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무선 이어폰이 고요한 혼자만의 공간을 가져다주었지만 어느새 무례하고 불쾌한 이웃이 돼 있었다. 커피 주문을 받는 직원을 살아 있는 이웃이 아니라 자판기 버튼처럼 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질문의 순서를 알기에 입 모양만 보고 순서대로 답을 뱉어내기만 하면 된다. 주문 내용은 맞으며 포인트 적립은 필요 없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겠다. 예, 아니요. 그 사이 이어폰에서 나오는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또 다른 소음으로 웅얼거리고 있을 뿐이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무장하고 정서적인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 동네 이웃의 인사말도 소음과 함께 음 소거 됐다. 무선 이어폰은 묵언 수행하는 스님의 표찰 같은 것이었다. ‘당신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는 광고판이며 이웃이 될 마음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무선 이어폰은 비대면 소통에 유용하지만 모든 관계를 비대면의 차원으로 물러서게도 한다.
캐나다의 철학자 마셜 매클루언은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신체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타인과 소통하게 해주는 것이 미디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새로운 미디어가 지구 반대편과는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는 단절한다면 얼마나 고약한 아이러니인가?
잃어버린 무선 이어폰을 다시 사야 할지 고민이다. 혹여 찾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맨 귀로 세상을 들으며 지내볼 생각이다. 음악과 뉴스와 어려운 스페인어로부터 잠시 휴가를 얻어보련다. 이참에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인사라도 건네 볼까 한다.
이경훈 (국민대 교수·건축학부)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