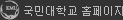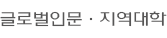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너섬情談] 수성 페인트 유감 / 이경훈(건축학부) 교수 | |||
|---|---|---|---|
|
한 대학의 모든 건물은 수성 페인트 칠로 돼 있었다. 사연을 물으니 이사장의 소신이라고 했다. 대학 캠퍼스에 흔히 쓰는 돌이나 벽돌보다 수성 페인트가 최고의 건축 마감재라는 믿음이었다. 값싸고 산뜻하며 지루해지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상 새 건물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 이만한 재료가 있냐고 되묻더라는 것이다.
정말 수성 페인트는 최고의 마감재일까. 가장 값싸고 손쉬운 재료는 맞다. 하지만 마감재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니 경제성이 선택의 기준일 수는 없다. 더구나 마감재는 건물의 인상을 결정한다. 재료와 색상, 질감이 건축주의 취향과 소양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의상과 같다. 역사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며 마감재 두께는 얇아지는 방향으로 진보했다. 고대에는 두터운 돌이 마감재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 건물 하중을 기둥이 지탱하고 외벽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다. 건물 전체를 유리로 마감해 내부와 외부의 구분도 지워버리는 극한의 투명성에 도달할 정도가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법이다. 초기 콘크리트는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노출 콘크리트는 매우 정교한 시공이 필요한 공법이다. 거푸집에 낸 작은 흠집도 그대로 굳어져 고칠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 판을 헐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특유의 현대적 질감 때문에 건축가들이 선호하는 재료이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고급 건물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 콘크리트 건물 대다수는 벽면을 흙손으로 보수하고 페인트를 바르는 것으로 마감한다. 재료도 공법도 발전하지 않았던 개발시대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수성 페인트보다 좀 더 품위 있는 마감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여럿 있다.
첫째, 페인트 칠만 다시 하면 새 건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은 어리석다. 칠의 배경이 되는 콘크리트 벽은 햇볕과 바람에 풍화가 일어난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무뎌지고 편평했던 벽은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걸 손으로 땜질하고 그 위에 칠을 해보지만 분명 그 추레한 느낌이 얇은 페인트 막을 비집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둘째로, 새 건물같이 보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돌이나 벽돌, 나무 같은 전통적 마감재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한다. 거주자는 물론이고 그 앞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와 바람과 햇볕을 머금은 건축은 근사하게 나이 든 노인의 주름을 보는 듯한 감동이 있다. 수성 페인트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고풍스러운 건물이나 도시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건물 마감재가 만드는 공간의 문제도 있다. 미국 건축학자 로버트 벤투리는 벽 두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공간의 안온함과 외부의 표정을 동시에 감당하는 벽이 건축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재료 본연의 색이 아닌 인위적인 페인트가 칠해진 외벽은 연극 무대 세트같이 창백하고 불편하게 만든다. 건물 앞의 외부 공간을 머물며 느끼는 공간이기보다는 빠르게 지나치는 일종의 ‘비장소’로 만들기 십상이다.
그 대학은 이제 육중한 석재와 세련된 유리 벽으로 마감된 건물로 바뀌어 근사한 캠퍼스 분위기를 만든다. 건축마감재에 대한 소신이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하고 바뀐 것이 분명하다. 수성 페인트 마감이 싸지만은 않다는 자각이 있었을 것이다. 건물마감재가 건물의 인상, 외부 공간의 질, 캠퍼스의 분위기 나아가서는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자고 나면 값이 오르는 우리 아파트가 여전히 수성 페인트 마감이라는 점은 한국 건축과 주거문화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세월이 흘러도 칠을 다시 하기만 하면 새집처럼 보일 거라는 믿음이 여전한 것일까. 말년의 오드리 헵번 같은 연륜 있는 주름 대신에 과도하게 성형 시술한 노인의 판판한 얼굴을 마주하는 듯해 민망하다.
이경훈 (국민대 교수·건축학부)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