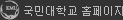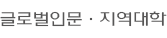언론속의 국민
| 회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 이은형(경영학부) 교수 | |||
|---|---|---|---|
|
이은형 국민대 교수·국민인재개발원장
신입 직장인이 퇴사를 결정하는 시점은 대개 3년 이내다. 그러다 입사 3년차를 넘기면 대개 안정기에 접어든다. 두 번째 고비는 7~8년차에 온다. 『서른다섯, 출근하기 싫어졌습니다』의 저자 재키는 이렇게 서술한다. ‘서른다섯쯤 되면 그만둘까 버텨볼까의 늪에 빠진다. 이직할까, 다른 직업을 알아볼까, 수도 없이 고민한다. 지금까지 영혼 갈아 넣으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허무함과 번아웃이다. 어느 순간부터 빠릿빠릿하게 실무를 해내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진다.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그로 인해 무기력해진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선배 세대는 안정적이고 익숙한 조직에 오래 다니는 것에 감사한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는 다르다. 딱히 이직할 곳을 정해둔 것도 아니고, 계획이 뚜렷하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퇴사를 꿈꾸고, 그리고 감행한다. 조직의 입장에서 퇴사를 꿈꾸는 잠재 퇴사자는 ‘경고음’과 같은 존재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경력에 맞게 더 성장하고 싶다는 의욕의 표시일 수도 있고, 중간관리자로 전환하면서 업무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고 싶다는 열망의 다른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번아웃이냐 성장이냐가 결정되므로 개인도, 조직도 그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에 따라 자신만의 해결법을 찾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퇴근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도해보는 사이드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배은지씨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 지금껏 배워보지 못한 것,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각종 취미와 배움 클래스를 다녀보기도 하고 친구와 ‘플리마켓’을 열면서 그 과정을 글로 써서 공유했다. 글을 쓰다 보니 회사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풀어내게 되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독자들의 공감과 응원도 큰 힘이 되었다.
배씨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사실은 회사 일을 잘해내고 싶은 사람임을 깨달았다. 영혼 없이 일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몫을 잘 해내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틔우며 계속 성장하고 싶은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는 글을 묶어 『회사가 좋았다가 싫었다가』라는 책을 펴냈다.
다른 밀레니얼 직장인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가 이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언론 기사, 자신이 발표한 보고서 등을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해설을 달았는데 팔로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보람도 느낀다. 이 활동을 계기로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자신의 영향력도 체감하게 되면서 더욱 업무에 몰입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정렬이 된 사례다.
인터넷에는 밀레니얼 직장인이 ‘회사 권태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랜선 사수를 자처하는 콘텐트 웹사이트에는 조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밀레니얼 직장인의 현실감 넘치는 극복기가 눈길을 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헤이조이스’가 주최하는 업무 노하우 워크숍에는 매번 신청이 넘쳐 매진을 기록한다. ‘원더우먼 프로젝트’ 등 그룹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번아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후기도 소셜 미디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 권태기’의 극복을 개인에게만 맡겨두어선 곤란하다. 아무리 랜선 사수가 훌륭하고, 회사 밖의 코치가 유능해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을 하는 선배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격려와 코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채워지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리더가 ‘코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